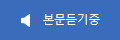|
여름 그늘은 길 위의 모든 사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하지만, 가을의 그늘에는 왠지 걷는 사람에게 대추 한 알을 건네주고 마음에 따라 그늘을 선택하게 하는 여유가 들어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불현듯 달라지거나 변할 일은 없겠지만 계절이 주는 감각을 견디다 못해 유난히 걸음걸이가 바뀌었다면 그중에는 필시 시인이 끼어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지닌 이는 시월이 오는 것을 나름 경계한다. 시월은 눈을 깊어지게 하고 사물에 대한 감정 반응이 조금씩 그 안으로 배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때에 이르면 타인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천리안 같은 눈을 간직한 이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바라보는 일이 아니라 들여다본다는 것. 이는 마음 안에 깊은 눈이 하나 더 있어서 사귀어 보면 상큼한 사과 향이 난다. 그래서일까,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사람 사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조금 씁쓸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대부분 알고 지내던 ‘지인’ 정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설탕에 침을 묻힐 때의 끈적거림이 덜 있어서 관계의 깊이를 가늠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한때, 거리감 없이 내왕하던 모임이었거나 또는 그들만의 공유의식으로 획일화된 친분의 정을 나누던 그들이 어느 날 밤송이 벌어지듯 틀어져서 누군가 한 알의 밤처럼 떨어져 나갔을 때, 헐거워진 밤송이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남은 밤알마저 떨어뜨리게 되니 결국 숨겨진 그들의 내부 정서가 아주 역겹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가식적 틀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페이소스다. 이런 경우는 주위의 소문만으로도 들끓고 넘쳐난다. 슬픈 일이다.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생면부지의 노랑나비를 무심히 혼자 바라보는 게 나을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 주변에는 큰 관공서가 두 곳이 있고 인근에는 그 관공서와 관련한 민간업체가 널브러진 종잇장만큼 많다. 일반인이 이곳을 드나들 때는 묘하게 얼굴이 무겁고 발걸음마다 휘청거리는 경우가 잦아서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곳이다.
점심시간이 되면 마치 개미집에서 개미 떼가 쏟아져 나오듯 근무자들은 밥을 찾아 대이동을 한다. 인파로 인해 주위의 모든 골목은 숨이 막힐 정도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식탁 유리에 부딪힐 때의 소리를 밖에서 들으면 그야말로 전쟁터의 총소리 같기만 하다. 이럴 땐 그 앞을 지나가는 필자의 몸 구석 구석마다 총알구멍이 수없이 생겨서 갑자기 생이 쓸쓸해져 버린다.
필자가 첫 근무를 시작한 날 가장 가까운 식당에 들른 적이 있었다. 두어 곳 식탁이 비었는데도 주인은 다짜고짜 한 명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얼굴이 달아오르고 또 무안스러워서 밖으로 나올 때는 두 어깨가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듯 힘이 빠진 기억이 있다. 내 돈 주고 먹는 밥도 눈치를 봐야 하니 세상은 도대체 어디까지 매정해지고 싶은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서 그날 이후로 필자는 30분 늦게 식당에 도착했으나 주방에선 이미 설거지 소리가 들려오고 홀로 상을 받는 것 또한 눈치가 보여서 식당 출입을 아예 그만두었다.
과감하게 도시락을 준비했다. 반찬 몇 종류는 재래시장에서 사고 밥만 마련해서 출근했다. 승용차로 10분 거리에 마침 공유 부엌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았다. 아무도 없이 혼자였고 평화로웠다. 집에서도 혼자였으니 설령 밖엔들 혼자라면 어떤가.
혼밥은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더구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 굳이 처량히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혼밥은 자신의 오감을 즐기는 것이며 맘껏 자신을 누리는 일이다.
혼자일 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익힐 줄 아는 이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2025.01.05(일) 16:07
2025.01.05(일) 16:07